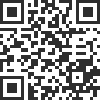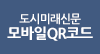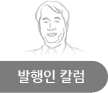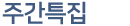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나 실업문제의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같은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국제경제 체제에 큰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2005년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태 파트너십 :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총 6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기술 개발 협력체
또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 에너지 부문에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을 목표한 바 있다. 환경산업을 통한 전략화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해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린 뉴딜 정책 중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뉴 아폴로 프로젝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재탈환하고자 기술개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의 에너지 고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녹색산업이 투자대상이다. 즉, 녹색산업은 농업-제조업-금융-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친환경적 경제체제로의 전황을 위해 추진됐다. 그 외 저탄소 경제 구축 기반을 위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 감축 및 연간 에너지 고효율 주택 100만 가구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성과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소비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보전 효과다. 분석결과를 보면 1000개의 지원기관 형성, 4000개 사기업 참여, 분기당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내후화 사업(단열, 창호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가구당 4695달러를 투입해 85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가구당 에너지 비용 평균 283달러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미국의 내후화 사업(WAP)의 정책 성과/그림=그린 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녹색전환연구소]
영국은 2020년까지 7000개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1000억 달러가 투자됐다. 특히 2018년 11월 런던시의 정책을 보면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0% 감축, 녹색 일자리 창출, 저탄소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인하 등 녹색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 창출했다. 올해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변경하는 친환경 건설산업 육성으로 올해 20~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녹색경제 실현을 선도하며, ‘Cool Earth(2007)’, ‘Clean Asia Initiative(2008)’, ‘후쿠다 비전(2008)’ 등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주요비전을 제시했다. 주요비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다. 2020년 14%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시작으로 2050년 60~8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후쿠다 비전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그린뉴딜 모델 사례/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국은 환경오염 주요배출국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환경을 개선하며 녹색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2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철도건설, 전력망 확충, 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에너지의 15%를 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할 계획이며, 송전소 증축 등에 700억 달러를 투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오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