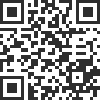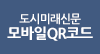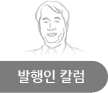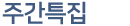[/자료=kalw.org/(public radio station based in San Francisco)]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는 1988년 『Memories and Proceedings of the Mancheter Literary & Pillosophical Society』란 문헌에서 최초로 등장했지만, 현재의 용법으로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Ruth Glass)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저소득 노동자와 그들이 살던 주거지가 중산층 사람들의 이입으로 대체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 계급이 도시 내부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가로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도시 노동자와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도심지 공동화, 슬럼화 현상 또한 잠재적 가치가 집중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gentry’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노동자 계급이 아닌 중산층의 이입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국내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뉴타운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부 주도적 개발사업과 민간 주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과 같은 도심 재활성화 정책을 통해 두드러졌다. 그러나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심 재활성화 방식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된 중산층에 의해 문화자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문화적 소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낮은 지가와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낙후된 구도심 지역은 예술가들의 주거지와 작업실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기능의 클러스터와 지역 특색이 더해진 개성 있는 소비 공간이 조성되었고,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가로가 재활성화되었다. 특히 홍대 앞, 삼청동, 가로수길, 이태원 등 예술가들에 의해 변모된 낙후 구도심 지역은 중산층의 문화소비 수요와 맞물려 상업화되는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 상업자본의 침투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의 유입 등으로 인한 획일화를 초래하여 초기 구도심을 재활성화 시킨 주체자들과 거주민들이 밀려나는 역기능을 발생시켰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2000년 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MF 이후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 쪽으로 눈을 돌렸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거대 자본을 앞세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획일화로 인해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기존에 저소득층 거주민들을 몰아낸다는 큰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과 역기능/자료=urban114]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모여든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씩 유명해지면서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대규모의 유동인구를 지닌 상업지구로 변화하게 된다.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하면서 저렴했던 임대료는 빠르게 상승하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의 문화 공간들은 동네를 떠나게 되며,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발길이 결국 문화 공간을 떠나게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유입으로 가로수길이 뒷골목으로 옮겨가며 나타난 세로수길, 번잡해진 이태원을 피해 인근지역으로 소규모 매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경리단길,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연극인들이 옮겨간 오프 대학로, 홍대 앞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작된 예술가들과 소규모 점포주들의 이주로 발생한 연남동·상수동·합정동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역기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을 전후로 성장한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와 함께 도심지 내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함께 맞물려 다양한 개성을 지닌 문화소비 공간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도시정책적 방향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개발 또는 정비 방식과 같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경제적 판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시민과 이용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