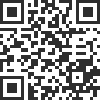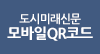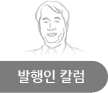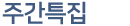[식물매트/자료=농촌진흥청]
도시농업법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형태는 5가지로 나뉜다.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심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다.
이 중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도시민이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는 주택이나 도심 속 건축물의 옥상 등 외부를 활용한 옥상정원 및 텃밭 등의 방법이다. 현재는 건설사 별로 아파트에 옥상텃밭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면 옥상텃밭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도심의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조경면적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옥상ㆍ난간 등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 이를 조경면적의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부터 도시농업을 고려한 계획을 하자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도심의 건물 벽면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건물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할 경우 16.6%, 벽면녹화까지 병행되는 경우에는 평균 30% 정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녹지비율이 높아지면 도로, 건물 등에 흡수되던 열이 반사되어 도시의 열섬 현상이 감소하고, 홍수 방지 효과도 제공된다. 그 예로 2011년 기준 서울시의 옥상정원은 총 202,449㎡으로 연간 3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의 옥상 정원과 텃밭, 벽면 녹화 등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도 있다. 옥상정원, 그린루프 등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카고의 경우, 그린루프사업을 통해 2500만ft²의 옥상정원을 구축해 자원순환형 생태도시로 변모했다. 또 일본 오사카의 NEXT21은 건축, 환경, 설비, 구조, 농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4계절의 변화, 해충 방지, 낙엽 처리까지 고려해 건물의 옥상과 테라스에 정원을 설계했다. 전문가들은 NEXT21이 식량 자급과 생태계 복원기능을 가진 미래형 주택을 구현했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 개발한 ‘그린매트’가 도시농업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매트’는 건물옥상이나 벽면 등 건물 밖과 도로에 띠녹지를 만드는 손쉬운 방법으로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식물매트이다. 이는 수직, 수평, 곡면, 사면 등 어떠한 형태의 대상지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식물매트로 시공이 간편하고 관리가 쉬운 새로운 개념의 녹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자생원예 식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식물로 만들 수 있으며 용도별, 환경유형별 다양한 시스템에 편리하게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기술이 활성화되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도심형 도시농업의 경우,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 등 수직형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도시농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도시농업이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도시를 녹화시키고,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