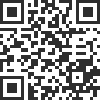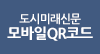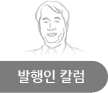[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전세계적 이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내외 여러 먹거리에서 검출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200㎛이하 크기다. 1㎛(마이크로미터)는 1㎜의 1000분의 1이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쓰레기가 잘게 부서지며 생성된다. 제품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스크럽·폼 클렌징 등 세안용 화장품, 치약 등의 제조시 미세플라스틱을 넣기도 한다. 이는 애초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nm, 1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크기로도 미세플라스틱은 존재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은 여러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극히 이들은 작아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강과 하천, 호수로 흘러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재활용 활성화/자료=환경부]
인체 내부 곳곳에 침투한다?
이미 우리 몸에는 이러한 미세플라스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150㎛ 이하라면 모든 인체기관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맥주, 생수, 소금 등 다양한 먹거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상황.
지난해 9월~10월 환경부가 시중 생수 6개 제품 조사한 결과, 평균 5리터 당 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으며, 모든 제품에 존재했다
천일염의 경우는 시판 중인 국내산 2종과 호주·뉴질랜드·프랑스·중국산 등 6종 모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해수부 ‘2017년 소금안전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천일염 1㎏당 프랑스산은 2420개, 중국산은 170개, 국내산은 최고 280개가 관찰된 것. 이 조사는 천일염을 증류수에 녹인 뒤 149mm 필터로 걸러 실험한 것이다.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중 유통되는 각종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해수부 조사 자료를 인용, 굴 100g 당 미세플라스틱 7개, 담치는 12개, 바지락은 34개, 가리비는 8개가 검출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멸치, 청어 도다리, 아귀, 대구 등에서도 개체당 1.04개~2.4개가 나왔다.
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지장
이에더해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추정할만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정창범 연구원과 공동 연구진은 50㎚, 500㎚, 6000㎚ 크기 플라스틱을 윤형동물(윤충류, 몸길이 0.1~2mm의 동물)에 노출시킨 결과, 작은 입자에 노출된 윤충동물 일수록 성장률과 번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렇듯 최근 플라스틱 내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정책적 접근을 시작했다.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턴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됐다.
단, 이 정도 감소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의 63개국 대상 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61.97㎏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쓰레기 양도 해마다 급증해왔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급감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3억 톤이며, 연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사이언티픽어드밴스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그 외 12%는 소각되고, 무려 80%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